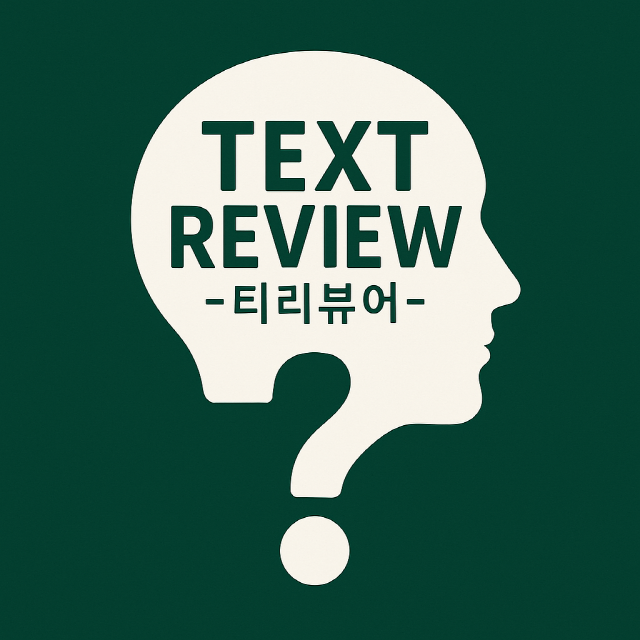비가 내렸다.
오전부터 축축하게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은 하루 종일 그칠 줄 몰랐다.
무작정 집을 나섰다.
서울의 여름비는 가끔 생각을 멈추게 해준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건 일부러였다.
비를 맞으며 걷는 감정을 잊고 싶지 않았으니까.
처음 발걸음을 뗀 곳은 연남동이었다.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비가 내리는 평일 오전, 거리는 한산했다.
카페 밖 의자는 젖어 있었고,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여자가 하나,
편의점 앞에서 우산을 펴는 남자가 하나,
그들과 눈을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저 스치는 풍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연남동은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졌다.
한때는 북적였고, 모두가 SNS에 남기는 “핫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씩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다.
골목 사이사이 오래된 한옥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벽돌 건물 사이로 무심히 자란 담쟁이가 유독 푸르게 보였다.
나는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밀리오네’라는 이름의 곳이었다.
낡은 창틀과 마른 꽃이 장식된 테이블,
바로 옆 창가 자리에서 라떼를 마시는 남자는 흰 셔츠를 입고 책을 읽고 있었다.
라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빗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카페 유리창엔 작은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맺혔다 흘렀다.
나는 그 물방울 사이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정확히 3년 전, 이곳에서 나는 누군가를 기다렸다.
결국 오지 않았던 그 사람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연남동엔 항상 그런 기억이 있다.
기다림과 끝남, 그리고 다시 걷기.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왔을 땐, 비가 더 굵어졌다.
내 우산이 없는 건 여전히 같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빗방울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생각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마포구청역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2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그 복잡한 환승 구간은 여전히 정신없었다.
물기 섞인 신발 바닥 소리,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
눈길을 마주치지 않는 도시의 법칙들.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굵어졌다.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서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통화를 했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채,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았다.
광화문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걷는 길은 늘 새롭다.
비가 내리는 날엔 특히 더 그렇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 누군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젖은 어깨를 움츠린 채, 조용히.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모두가 조금씩 외롭다는 것을.
다들 제각각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나는 종로 한복판을 건넜다.
예전엔 회사가 이 근처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에서 같은 김밥을 사먹던 시절.
그때는 삶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안정감조차 그립다.
종각역 근처 ‘종로서적’ 앞을 지나면서
문득 책 한 권이 떠올랐다.
“가장 서울다운 감정은, 그리움이다.”
누군가 그랬다.
이 도시는 누군가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리라고.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오자, 거리엔 다시 사람들이 붐볐다.
퇴근길을 앞두고 하나둘씩 우산이 늘어났다.
나는 종로3가역으로 들어가,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가방은 축축했고, 셔츠는 등판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비에 흘려보낸 것 같았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런 곳이다.
지친 마음이 머물 곳이 없을 때,
걷다 보면 말없이 받아주는 거리 하나쯤은 있다.
그게 연남동이든, 광화문이든, 종로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직
우리 같은 사람들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