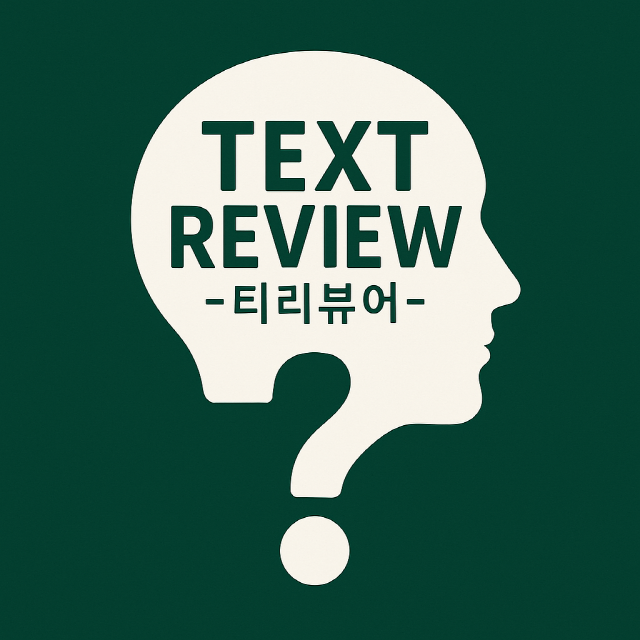지금, 여기, 이 길 위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낡은 철문과 벽돌 담벼락 사이로 피어난 능소화가 노을을 안고 있었다. 그 길목을 지나던 순간, 나는 그 문장을 떠올렸다.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이란 없다.”
그리고 문득 내 삶을 돌아봤다. 나는 언제나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다.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만 그 나중은 한 번도 내 앞에 선명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바로 그 골목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음을 멈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인생의 정거장 하나를 지난다는 걸 알았다. 정거장 이름은 ‘지금’.
시간을 미루며 살아온 날들
중학교 때, 나는 그림을 좋아했다. 혼자만의 세계를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를 숨기는 일이 좋았다. 그러나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형편도, 내 자신감도 그 말을 삼켰다.
고등학교, 대학, 취업. 늘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나는 자꾸만 내 꿈을 “나중에”로 미뤘다. 언제쯤일까. 정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나중’은 늘 현실보다 연약했고, 더 멀어졌으며, 때론 아예 사라졌다.
선택의 순간들, 지금 아니면 없었다
2019년 5월, 회사에서 두 번째 승진 기회가 왔다. 팀장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나에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고, 성과를 내면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그 즈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간병인을 구해야 했다. 나는 망설였다. 정말 이 타이밍에 회사를 잠시 그만두는 것이 옳은 걸까?
결국 나는 휴직계를 냈다. 커리어는 멈췄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 창가에 앉았던 그 봄날의 햇살은 아직도 내 뼈에 남아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바꿨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기회를 기다리느라 지금을 흘려보내는 건, 삶을 한 장씩 찢어내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는 것들
나는 한강대교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다. 이 도시에는 매일 수많은 선택들이 떠다닌다. 회사에 남을까, 퇴사를 할까. 사랑을 고백할까, 말까. 용서를 구할까, 자존심을 지킬까.
우리는 대개 ‘때가 되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삶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사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삶이 짧다면,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자주 이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대답이 따라온다. ‘지금.’ 지금 말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하고, 지금 살아야 한다.
지금을 사는 용기에 대하여
나는 최근,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진정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대로 산다. 아침 햇살을 마시는 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일, 하고 싶었던 글을 쓰는 일, 그 모두가 지금의 삶이다.
나중이 아닌 지금을 위해
서울역 고가 위, 노란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걷는다. 어떤 이는 퇴근길이고, 어떤 이는 여행길이며, 어떤 이는 이별 후 첫 걸음일 수도 있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 이 순간이 끝이라면, 나는 후회할까?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에 말할 수 있다.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이란 없다. 지금을 살아라. 삶은 그리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