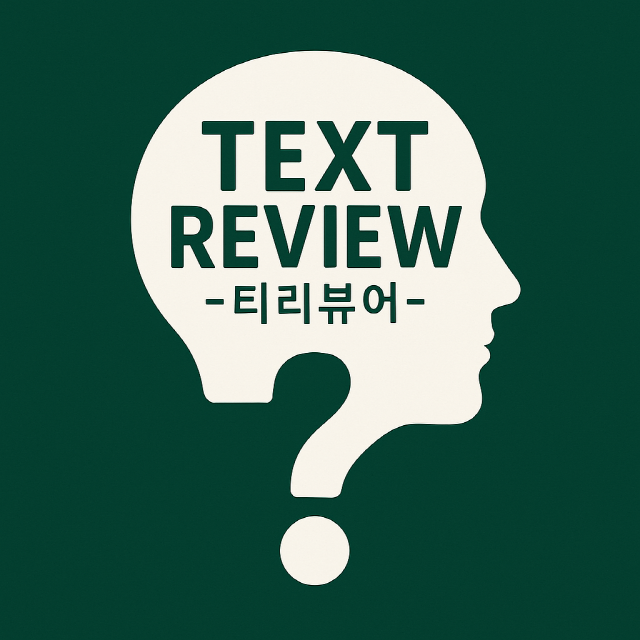퇴근 후 2시간, 나를 복원하는 기술 – 루틴이 아닌 회복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흔히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그때부터 진짜 오늘을 시작한다.”
—
삶이 흘러가기만 할 때, 퇴근 후는 유일한 저항의 시간이다
출근 후부터 퇴근 전까지의 시간은 대부분 타인의 요구에 맞춰 흘러간다.
회의, 메일, 보고서, 눈치…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행동의 주도권은 항상 바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의 2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건 자기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간,
삶이 흐르는 방향을 잠시 멈추고 내가 선택하는 감정을 다시 짓는 ‘복원’의 시간이다.
—
루틴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의 회복이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지.”
“자기 전에 책 10쪽씩이라도 읽자.”
“하루를 정리하는 저널을 써야겠다.”
하지만 이런 의무는 때때로 또 다른 ‘성과’의 무게로 다가온다.
루틴은 분명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루틴은 감정의 뿌리 없이 지속될 수 없다.
진짜 필요한 건,
루틴을 만들기 전, 감정의 고요를 회복하는 것이다.
—
나를 복원하는 3단계: ‘정적-접촉-기록’
① 정적(靜寂): 머릿속 소음을 줄이는 침묵의 10분
집에 돌아오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침실 서랍에 넣고, 조명을 낮추고, 물 한 컵을 마신다.
음악도 끄고, TV도 끈다.
단 10분간, ‘입력’을 멈추는 것이다.
그 10분이 지나면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오늘 느꼈던 감정, 놓친 말, 감당하지 못했던 미묘한 불안감까지.
② 접촉: 나만의 온도와 연결되는 행동 하나
그 다음엔 오직 나만의 시간을 채운다.
어떤 날은 캘리그래피를 하고,
어떤 날은 조용히 향초를 피우고 바닥에 앉아 고개를 든다.
포인트는 생산적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고르게 숨 쉬게 해주는 연결의 시간이다.
③ 기록: 감정을 정제하여 남기는 문장 한 줄
마지막은 짧은 문장 한 줄.
블로그든, 노트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좋다.
오늘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해소하는 글쓰기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말보다 나의 표정을 더 믿기로 했다.”
“침묵 속에서 나의 소리가 들렸다. 그건 외롭지만 따뜻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서 내일은 덜 억울할 것 같다.”
—
회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조용한 확신이다.
나는 회복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혼자 있는 시간의 질에서 비롯된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가장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이다.
—
마무리: 당신에게 묻고 싶다
퇴근 후,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복원하고 있는가?
그 시간은 정말 ‘쉬는 시간’인가, 아니면 ‘소진된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인가?
하루에 단 2시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외부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
—
삶은 회복의 연속이다.
그리고 퇴근 후 2시간이, 그 복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