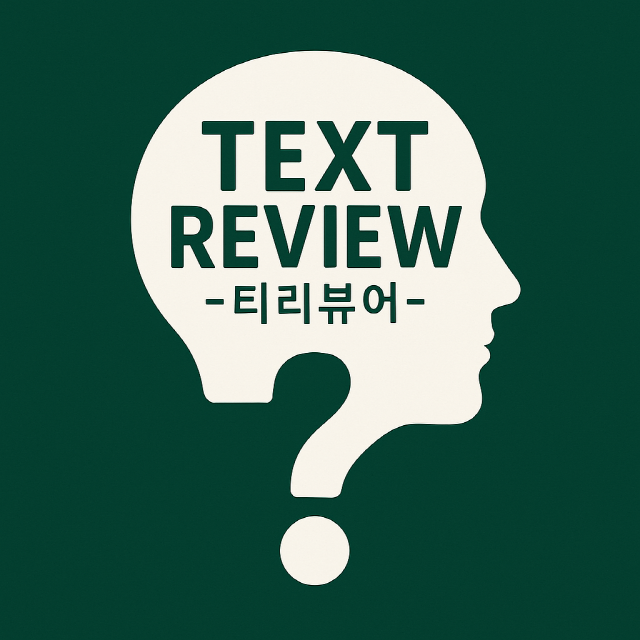밤이면 더 깊어지는 불안의 이유 그리고 신뢰의 본질
아이가 열이 나면, 마음이 무너진다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전문가가 된다
새벽 두 시, 평화가 깨지는 소리
휴대폰 알람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아닌,
작은 아이의 뒤척임과 기침 소리가 나를 깨웠다.
머리맡에서 “엄마… 뜨거워…”라는 아이의 말이 들렸다.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느껴지는 그 익숙한 불길함.
뜨거웠다. 아주 뜨거웠다.
체온계는 39.4도.
다급하게 해열제를 찾아 아이의 입에 넣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다음이 문제였다.
기다림. 그리고 더딘 반응.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불안이 밀려왔다.
“응급실… 가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해가고, 와이프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다.
내가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는 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병원 가서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을까?
괜히 갔다가 괜찮다고 하면…?
괜히 아이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결국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앉아 체온계를 다시 들었다.
39.1도. 여전히 고열이었다.
그 순간, 한숨이 깊어졌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의 아이러니…
결국 새벽 4시 무렵,
나는 아이를 둘러업고 차에 올랐다.
24시간 소아응급실은 조용했고,
대기자는 몇 명 없었지만 절차는 여전히 길었다.
간호사가 묻는다.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해열제는 언제 먹였나요?”
“기침은 언제부터 했고, 콧물은 났나요?”
의사는 청진기를 아이 가슴에 대고는 몇 초간 듣고 말했다.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성 감기 같네요.”
진단은 간단했고,
결국 해열제와 일반 감기약 처방전이 손에 들렸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전문가가 ‘괜찮다’고 말해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냈다.
부모가 믿고 싶은 단 하나 : 확신
그날 이후로 깨달았다.
사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치료 그 자체보다 ‘확신’을 얻고 싶어서라는 걸.
“응급상황은 아닙니다.”
“해열제가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엄마 아빠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약의 성분보다 중요한 건
그 약을 처방한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이었다.
전문가의 말은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는 전문가를 신뢰한다.
그들의 지식도 믿지만,
그들이 쌓아온 시간과 경험,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판단력’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다르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아무 일 없을 겁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성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감정적으로는 한결 편안해진다.
전문가는 그래서 지식의 전달자이자, 감정의 조율자다.
전문가,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유
전문가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패를 견디고,
타인의 불안을 함께 견뎌본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육아라는 영역에서는
의사, 교사, 상담가, 그리고 때론 부모 자신이
서로 다른 전문성으로 협력해야 한다.
부모인 나 역시도
아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가까운 관찰자’로서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야 했다.
부모도 전문가가 되어간다
나는 아이의 열을 감지하는 속도,
해열제를 먹인 뒤 반응 시간,
콧물의 색깔과 기침의 리듬까지
하나하나 몸으로 익혀갔다.
매일이 훈련이고,
매 순간이 테스트였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의 눈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첫 번째 의사’인지도 모른다.
전문적인 학위는 없지만,
심장으로 아이를 관찰하는 진짜 전문가.
그날 새벽,
아이가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이마에 다시 대본 손에서
조금 차가워진 체온이 느껴질 때,
나는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 내 삶에서,
누군가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믿음으로 전달되려면,
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정보가 아니라 확신이다.”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바로 진짜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