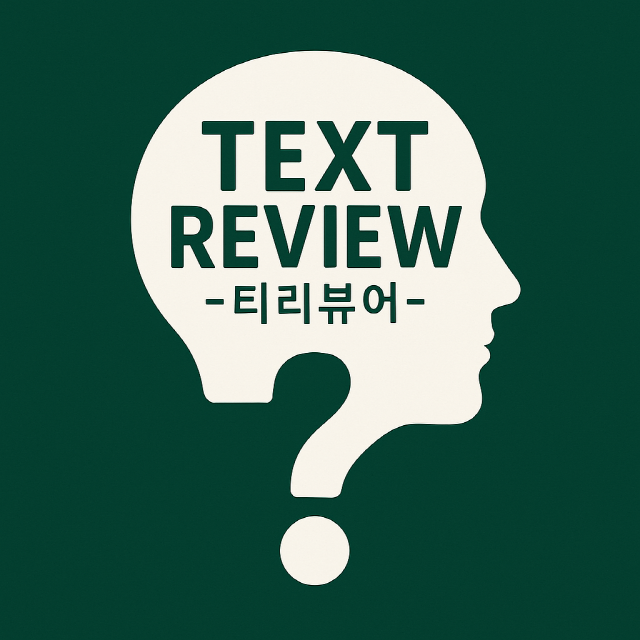꿈을 꿨다.
기분이 영 좋지 않은, 어딘가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기회.
그런데 발령지는 남쪽 바닷가였다. 파도 소리도 낭만도 사라진, 허망한 남쪽이었다.
그 순간, 난 갑자기 기존 회사를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황급히 퇴사를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자리는 사라진 뒤였다.
알람소리에 눈을 떴다.
침대는 축축한 기분으로 눌려 있었고, 눈앞은 흐릿했다.
몇 년 전, 진짜로 퇴사를 고민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재생되어 있었다.
왜 하필 지금, 그 기억이?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는데 샴푸가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어긋나 있는 아침. 괜히 발끝이 차가웠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오늘 무엇을 챙길지 5초,
무엇을 입을지 5초,
어떤 신발을 신을지 5초.
15초간의 조용한 자문이 끝나고,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냥 걷기로 했다.
출근길에 숨을 들이쉬고 싶은 날이었다.
갤럭시 버즈 프로를 귀에 꽂고, VIBE에서 ‘윤하 – 사건의 지평선’을 재생한다.
이어지는 ‘소란 – 있어주면’은 늘 그렇듯 첫 소절에서 나를 멈추게 한다.
그렇게 나는 인왕산 성곽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서촌은 전날밤의 왁자지껄함이 증발한 듯 조용했다.
사직단은 기침 소리조차 울릴 듯한 적막을 품고 있었고,
경복궁 앞마당엔 새소리도 머뭇거렸다.
정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서울의 새벽은 늘 낯설 만큼 정갈하다.
멀리서 마이크로소프트 빌딩이 보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미디어월엔 ‘2023 송현동 솔빛축제’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겨울 아침의 휑한 공기 속에서 묘하게 눈부셨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앞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베고 있는데도 그들 얼굴은 따뜻했다.
기다림이라는 온기.
그 안엔 분명 누군가를 위한 빵, 혹은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메일 알림이 연달아 울리고, 팀장님의 목소리가 뒤를 잇는다.
처리할 일들이 쏟아져 내린다.
몇 개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운 업무가 할당된다.
어느새 또 하루가 굴러간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내가 바랐던 삶일까?
언제부턴가 나는, 내 시간과 생각을 임대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지금 받는 월급은 당신의 능력값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사용료”라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빨리도 흘러간다.
어쩌면 시간은 내가 의식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며 일하지만, 결국 남는 건 피곤한 몸과 멍한 시선뿐.
그래도 오늘은 나를 너무 방치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이 일의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같은 최선을 써야 하니까.
점심시간.
쫓기듯 도시락을 먹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클릭, 클릭, 클릭.
내 하루의 리듬이 반복된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퇴근 시간이 된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한다.
적당히 붐비는 열차 안, 서로 말 한마디 없지만 어깨와 어깨가 가깝다.
그 작은 체온 속에서 나는 오늘을 내려놓는다.
문득 생각한다.
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그냥 ‘플레이어’로 남고 싶다.
이 삶이라는 게임에서
가끔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평범한 플레이어.
무언가를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오늘도 살아낸 하루.
그 사실만으로도 이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
그렇게 오늘의 기록을 마친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이 길을 걷는다.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기회가 아닌 지금의 나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