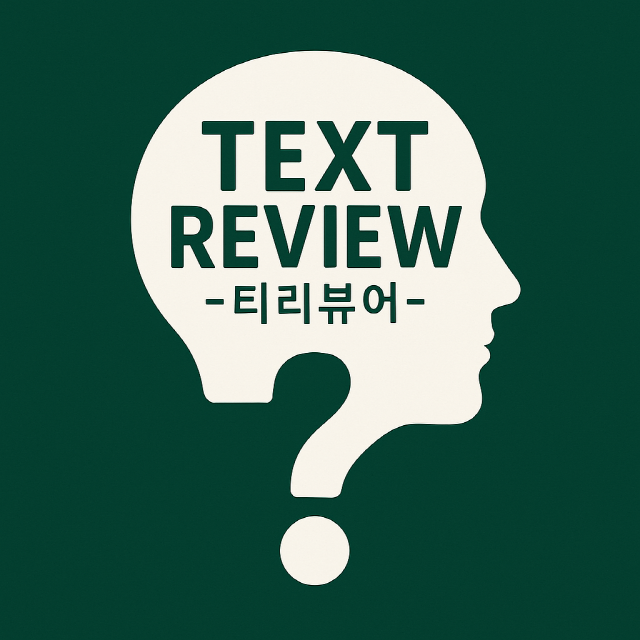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후 두 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카페에 도착한 나는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았다.
습관처럼 시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오늘따라 조금 더 쓴맛이 느껴졌다.
유리창엔 물방울이 엉켜 흘렀고, 흐릿한 유리 너머로는 사람들의 우산이 흐느적거렸다.
거리는 조용했다. 아니, 조용해 보였다.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자주 이곳에 온다.
굳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어쩌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남아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딱히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어떤 감정은 형태보다 잔상이 더 오래 남는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카페 입구의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들어선 건, 너무도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목선까지 젖어든 셔츠, 그리고 연한 베이지빛 재킷.
그녀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매일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습관처럼 카페 라떼를 시킨 그녀는 유리창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 좋아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러워, 어제도 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응. 좋아했었지. 아니, 지금도 좋아해.”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어떤 슬픔이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건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오래된 이해에 가까웠다.
우리는 오랜 침묵 끝에, 비로소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멀어졌을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이유야 많았다.
시기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여유가 없었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말 한마디가 부족했던 것도, 너무 많았던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굳이 설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나는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우리가 너무 빨리 자랐던 것 같아. 감정보다 앞서 버렸달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웃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속도와 상관없이, 우리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어떤 감정은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라앉아 남아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함께 오래된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때 먹었던 연어 샐러드 이야기, 좋아했던 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투었던 날.
그날 나는 너무도 서툴렀고, 그녀는 너무도 지쳐 있었다.
“사실… 다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되받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결말이 필요할까?
때로는 아무런 결말 없이 남겨진 이야기들이 더 오래 남는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흐릿했고, 사람들은 젖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다.
그녀는 떠나는 뒷모습을 남기며 말했다.
“비가 그치면, 또 괜찮아질 거야. 우리처럼.”
나는 웃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지금은 흐리지만, 결국엔 개이겠지.
지금은 젖어 있지만, 결국엔 말라가겠지.
지금은 멈춰 있지만, 결국엔 다시 걷게 되겠지.
그녀가 떠나고, 나는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잔에 남은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빗소리는 조금 더 약해져 있었다.
나는 다시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빗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오늘의 이 감정을 글로 남기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오늘의 이 비가,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라며.